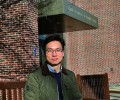| 한담객설閑談客說: 손글씨 |
| 보스톤코리아 2015-10-19, 11:56:38 |
|
보스톤 가을이 깊어 간다. 날은 청명하고 화려한데,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줄을 잇는다. 일을 당한 분들께 위로 인사를 전한다. 어릴적 연필로 눌러쓴 학교 숙제 일기장이다. 선친이 얼핏 삐뚤빼둘 내 글씨를 보셨다. 얼굴을 찡그리셨다. 마뜩치 않다는 표정이신 게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애당초 선친은 당신의 아이 교육에 무관심하신 척 하셨다. 선친은 직장에서 하시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러니 집에서까지 당신의 아이 숙제를 챙기지는 않으셨다. 일기 내용이라야, 밥먹고 학교에 갔다는 말밖에는 없었을 게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을 덧붙였을 터. 당신은 일기내용에 언찮아 하신건 아니다. 손글씨를 못마땅해 하셨다. 선친은 명필이셨다. 외람되게 선친의 필체를 뭐라 말할수는 없다. 하지만 어린 내가 보고 감탄하기에 충분했다. 한국 동회서기의 직업적인 글씨체와는 달랐다. 그렇다고 내가 선친의 글씨체를 따라 쓰고자 했던 건 아니다. 차라리 젊은 글씨체였던, 내 가형의 글씨가 더 멋져 보였다. 푸른색 잉크를 펜촉에 묻혀 대학노트에 얌전히 쓴 몇줄의 베낀 시詩였다. 형의 공책은 물론 몰래 훔쳐봤다. 형이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게다. 내 아이의 손글씨만 엉망인줄 알았다. 녀석이 아직 어릴적에 정성드려 쓰면 제법 썼다. 영어건 한글이건 내가 보기에 괜찮았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녀석의 글씨체는 도저히 알아 볼수가 없다. 그걸 알아서 읽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하다. 풀지 못할 암호를 보는듯 싶은데도 말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은 애당초 퇴색해 간다. 그나마 아이의 글씨체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도종환 시인이다. 이 물결 위에 손가락으로 써두었던 말 노래에 실려 기우뚱거리며 뱃전을 두드리곤 하던 물소리 섞인 그 말 밀려오는 세월의 발길에 지워진다 해도 잊지 말아다오 내가 쓴 그 글씨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음을 (도종환, 종이배 사랑 중에서) 지난 몇년간 해마다 받았다. 김지수사모님에게서 받은 성탄절카드 이야기이다. 먼저 보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먼저 받은거다. 처음 받아 펴서 읽고는 몹씨 놀랐다. 활달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각角진 필체는 남자의 글씨처럼 힘찼기 때문이다. 그만큼 격정적이기도 했다. 혹시 동명이인의 남자가 보낸것이 아닌가 했다. 옛 어른들 냄새가 짙었던 거다. 작은 몸집에서 어찌 그다지도 글씨에는 힘이 넘치시던가. 하긴, 사모님 생전에 모든일에 활력이 넘쳤다. 수줍은 미소와 크지 않은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사모님의 속마음은 넓고 깊었고, 활화산 불꽃이었을테니 말이다. 역시 글씨체에는 글씨 주인의 마음이 보이는 모양이다. 한번 더 화려한 사모님의 육필 카드를 받아 보았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또 놀라고, 읽고 감격했으면 좋으련만. 사모님이 보내 주신 카드는 곱게 보관하고, 이따금 들춰 보면서 즐긴다. 이제는 들춰 볼적 마다 사모님을 회상할 수 밖에 없겠다. 그렇지 않아도 몇자 안부인사를 적어 엽서한장 달랑 보냈는데 받아 읽지 못하고 가셨구나. 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냥 보내 드렸다. 김지수사모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것이 내 글씨입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3:17, 공동번역)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