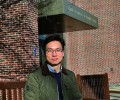| 한담객설閑談客說: 흙과 바람 |
| 보스톤코리아 2022-03-14, 11:16:48 |
|
통찰洞察. 이어령선생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다. 말이야 어렵다만 자주 쓰인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사전적 풀이인데, 과연 선생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 해야겠다. 중학교 2학년 적이다. 겨울방학도 마친 2월이었다. 교실은 불기없는 난로만 오히려 썰렁했던 시기였다. 덩달아 학과시간은 시들할 수밖에 없었다. 교탁에 오른 선생님을 향해 아이들이 요구했다. 교과서 보단 이야기! 짐짓 망서리던 선생님. 허흠. 헛기침과 아울러 이야기를 풀어 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는 흥미만점인데 한국이야기 였다. 조는 아이도 없었고, 듣는 자세가 흔들리는 아이도 없었다. 곧 수업 종료 종이 울렸다. 아쉬움이 컸기에 아~ 탄성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선생님의 이야기 내용은 ‘흙속에 저 바람속에’ 에 나온 것들이었다. 선생님은 책을 이미 읽었던 거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다. 흙과 바람. 풍토風土라 해야겠는데, 바람풍風과 흙토土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목대로 선생의 책에선 한국과 한국인의 풍토를 풀어 헤쳤다. 선생의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삼은 건 물론이다. 정녕 한국과 한국인의 바람과 흙이었고, 책은 얼마나 팔렸고 읽혔다 했던가. 책에서 기억하는 게 있다. 선생이 봤던 한국의 식食문화. 곧 ‘먹는’ 한국 문화 다. 쌈 싸서 먹고, 찬밥에 물말아 훌훌 먹는 문화. 어디 쌈과 밥뿐이랴. 나이도 먹으며, 축구에선 골도 먹는다. 또한 마음도 먹는데, 욕도 먹고, 애도 먹고, 챔피언도 먹는다. 말도 먹힌다 하는데, 선생의 말은 한국독자들에게 제대로 먹혔던 거다. 선생의 언변 또한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은 달변이면서 송곳같은 날카로움이 같이 했다. 해학과 웃음과는 거리가 있다만, 깊고 예리하다 해야겠다. 날카롭게 보는 눈과 경쾌하게 해석하는 능력이야 누구도 쉽게 따를수없는 거다. 넓고 깊은 통찰력이 없다면 어림도 없었을 터. 역시 먹히는 화술이었다. 책이 첫 발간된 건 1960년대 중반이었다. 이미 반세기가 훌쩍 넘어선 거다. 그런데 현시대 한국의 풍토는 달라졌던가?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던가. 한창 유행하는 융합이란게 과연 한민족 DNA에 잠재하고 있는 걸까? 궁금증만 더해 간다. 이것이 한국이다. 책의 부제副題라 했다. 이젠 이것이 한국이었다로 바꿔야 할까. 이어령교수가 돌아갔다. 한시대의 지성이 세상을 떠났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의 책을 다시 읽어야 겠다. 바람을 저울로 달아 내보내시며 (욥기 28:25, 공동번역) 첨언: 이 란欄 (2016년10월 1일)을 통해 같은 제목으로 졸문을 지은적이 있음을 밝힌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