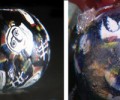| 한담객설閑談客說: 입맛도 그리움 |
| 보스톤코리아 2015-01-19, 11:36:04 |
|
한창 겨울이 깊다. 올 겨울은 시작이 미약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창대해졌다. 하긴 달력으로는 이미 대한大寒이 아니던가. 가장 춥다는 시기이고, 아닌게 아니라 무지 춥다. 그런데 아직 눈은 세게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나 올꺼나 저제나 내릴까 조바심으로 마음을 떤다. 아내가 또 한마디 거든다. ‘올 때가 되면 올텐데, 무슨 호들갑이냐?’ 핀잔이다. ‘첫눈’ 이란 시조다. 시인은 바리톤이라 했는데, 읽는 나는 야구를 떠올렸다. 일회 초 일번 타자가 초구를 당겨 펜스를 맞춘 삼루타를 연상케 했던 거다. 첫눈은 잘맞은 타구打球만큼이나 장쾌하다. 제목을 폭설로 바꿔 읽는다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첫날부터 바리톤이었다, 목청이 좋았다 낮고 굵은 성량으로 곳간 가득 들어찼다 약골의 겨울 들녘도 뱃심 좋게 우거졌다’ (박명숙, 첫눈) 눈 내리는 한 밤이었을 게다. 어린 나는 감히 방 밖을 내다 볼 수 없었다. 그날도 폭설이었을 테니 말이다. 한창 겨울밤인데 방바닥은 쩔쩔 끓었다. 엉덩이가 무지 뜨거웠다. 거의 고기 탄내가 날 정도였으니 말이다. 천정은 낮아 방안공기는 따습고, 구수했다. 어머니는 얼음 뜬 김장김치에 국수를 말아 주셨다. 그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었다. (어머니는 찡이라 했던가. 쩡이라 발음했던가. 말씀 중에 얼음판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말이 황해도 말인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디저트로는 언 사과가 제일이라 했다. 어머니는 말씀으로만 입맛을 돋궈 주셨다. 사과는 반드시 얼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황주사과라야 한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 입맛이지, 내 입맛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맛보려 보스톤사과를 일부러 얼릴 수도 없다. 황주사과를 구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말아주시던 그 김치말이 맛은 여전할 겐가. 시詩가 눈에 익었다 싶었다. 김지하가 술에 취해 청진동 선술집 벽에 낙서처럼 휘갈겨 썼던 시란다. 이만한 시를 읽고 욀 수 있는 시가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던가. 읽는 나 역시 눈이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 옛적 고향집 마당이 눈앞에 보인다. 내 그리움이 시인의 그리움보다 못하지는 않을진대. 한 겨울에 함박눈 쏟아져 내리면 더 아련한게다. 이용악 시인이다. 광화문 글판에 지난 달에 달렸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이용악, '그리움' 에서, 광화문 글판) 언 배(梨)를 동이凍梨라 알고 있다만, 언 사과는 한자로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다. 내 나이가 더 들면, 내 스스로 나를 동이凍梨라 부르려 한다. 배도 겨울에만 언다. 여름에 어는 배를 본 적이 없다. 냉면엔 배 한 조각이 올라간다. 밤이 늦었는데, 냉면을 삶아 김치국물에 말아 먹을 꺼나? 아내가 투덜거릴 게다. ‘아닌 밤중에 왠 밤참?’ 내 대꾸다. ‘입맛도 그리움이다.’ 찬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모든 물줄기는 걸음을 멈추고, 물살은 얼음의 갑옷을 입는다. (공동번역, 집회서 43:20)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