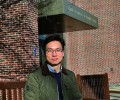| [ 오르고의 횡설수설 1 ] 삶은 계란을 보내며 |
| 보스톤코리아 2019-09-16, 12:07:54 |
|
냄비 속에서 계란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익어간다. 나는 정확히 12분을 기다려 불을 끈다. 그는 딱 그렇게 익힌 계란 두 개로 하루를 시작했다. 노른자만 쏙 빼놓고. 아니, 내 정신 좀 봐. 오늘도 또 계란을 삶다니. 지금 그는 없다. 거의 20년을, 정확히 18년 5개월을 함께 했지만 떠나는 건 한 순간이었다. 추리닝 차림에 달랑 가방 하나만 가지고, 마치 화장실을 다녀오듯, 혹은 편의점을 다녀오듯, 그는 그렇게 떠났다. 한번쯤 뒤돌아볼 법도 하건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미련 따위 일랑 눈곱만치도 없다는 듯, 어쩌면 저렇게 쌩하니 가버릴 수가 있을까. 저렇게나 냉정한 면이 있었구나 싶었다. 배신감인 허탈감인지, 아니면 그냥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쿨~하게 보내주자, 질척거리지 말고. 하지만 냄비에 물을 붓고, 계란을 넣고, 시간을 재는, 거의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이 자동화된 절차들은 어쩌란 말인가.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습관의 힘이란 확실히 이성보다 강한가보다. 어쩜 건망증 때문인지도 모르지. 내 나이도 이제 적지는 않으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음을 난들 왜 모르겠는가. 그러니 그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다. 만남과 헤어짐은 언제나 짝으로 다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긴 시간이 끼어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만다. 그리고는 이 특별한 만남에는 절대로 헤어짐이 없으리라는 말도 안되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나는 자꾸만 심사가 뒤틀린다. 나쁜 놈. 떠날 거면 애초에 오지를 말던가.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 한마디를 살갑게 해준 적도 없잖아. 그저 방에 틀어박혀서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투명 인간이었는걸. 차라리 잘 됐지 뭐. 마침 잔소리하기도 지겨워지기 시작했었는데. 치약 쓰고 제발 뚜껑 좀 닫아라, 소변 튀지 않게 앉아서 용변봐라, 밥 먹고 그릇에 물 좀 부어라 ... 나에겐 간절한 민원들이 그에겐 한낱 잔소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는 잔소리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민원들에서 해방되었다. 뭘 물어보면 그저 응, 아니, 외마디 소리만 퉁명스레 내뱉던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갑자기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빌어먹을 계란같으니라구. 나는 안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그런데도 시선은 자꾸만 현관을 향한다. 투명인간 같았던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까지 클 줄이야. 불 꺼진 그의 방을 볼 때마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밀어 오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감정을 억누를수록 또 다른 감정이 부풀어 오른다. 떠날 때만 하더라도 쿨~하게 보내주었는데. 이건 뭐지? 쿨~ 한척 나 자신을 내가 속인 건가. 모르겠다. 모든 시작은 결국 끝을 향한 질주일 뿐이다. 하지만 끝이 왔을 때 우리는 미처 준비되지 않는다. 아무리 예고된 끝이었다 하더라도 도리가 없다. 하물며 20여년을 함께 했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시작이 있을 때마다 다가올 종말의 상처를 경계해왔건만. 하지만 종말이 올 때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길들여지기는 어린왕자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었는데. 짧은 투병 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별이었음에도 그때 나는 슬픈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었다. 경황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그저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낀 건 한 참이 흐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였다. 이젠 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나는 자기최면을 건다. 돌아오겠단 싸구려 약속조차 그는 하지 않았다. 삼류 소설에선 흔하디흔한 그 알량한 거짓말조차 고지식한 그의 머릿속에는 들어설 공간이 없었던 것인지. 여자 마음 모르기는 예나 지금이나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푸념을 한들 무슨 소용이람. 나도 이젠 내 길을 가야지. 어차피 삶은 혼자만의 고독한 선택과 후회로 이루어진 모노드라마인 걸. 계란 따위는 다시는 삶지 않으리라. 갑자기 기차 경적이 울린다. 부엌 창문으로 스쳐지나가는 통근열차가 오늘따라 낯설다. 저 기차는 알까. 자신이 싣고 가는 누군가의 남자들, 또 누군가의 여자들이 얼마나 큰 헤어짐의 상처를 뒤에 남겼는지. 떠나는 자들이야 아무 생각도 없을 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겨진 사람 생각할 건덕지가 눈곱만큼도 없을 테니까. 눈이 앞에만 달렸으니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지. 남편 따라 미국 간다고 홀어머니를 남기고 떠났던 내가 아닌가. 엄마는 바로 그 해를 넘기지도 못하셨다.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남긴 상처는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받은 상처만 아파하고 있다. 그를 떠나보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18년 5개월 전 그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있을 걸.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