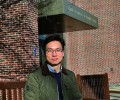| 둥근 빛 (2) |
| 보스톤코리아 연재소설 |
| 보스톤코리아 2018-04-30, 10:35:48 |
|
량이 여섯 살 때 태어난 남동생은 량이 아홉 살 때 갑자기 죽었다. 동생의 출생과 죽음이 있었던 오 년 동안의 기록이 어린 계집아이의 기억 속에 묻혀 있다가 가끔 아득한 햇살 속에 서 있을 때 문득문득 한 가지씩 건져 올려졌다. 왜 햇살일까? 커다란 나무 밑에 서 있으면 나뭇잎과 나뭇 가지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 땅 위에 둥글둥글 떨어져 퍼져버리는 그 빛의 납작함은 량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끌려 들어가게 했다. --엄마가 사정없이 후려쳐 내리는 회초리에 까무룩 기절한 뒤 눈을 떴을 때 귀신같은 엄마의 얼굴에 떨어져 내린 빛으로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엄마의 콧날과 약간 벌어진 입술과 텅텅텅 구멍이 깊은 두 눈으로 나뭇가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량은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있었다. 매질로 기절한 여섯 살 딸아이가 정신이 들자 흙바닥에 내버려 두고 엄마는 허청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밖을 내다보고 있는 노 할머니와 밖을 내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며 량은 엄마를 애달프게 부르며 따라갔다. 부엌 문턱을 넘었을 때 엄마가 량을 휘어 감으며 가마솥 옆에 앉혔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눈짓을 보내고는 과일 말린 것을 하나 쥐여주었다. 그제야 안심이 된 듯했는데 그 순간 량은 발작을 일으켰다. -- 그 기억은 묻혀 있었다. 그 기억은 량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던 한 어린 남자와의 세 번째 섹스에서 덜컥 임신이 되었던 것을 확인 한 그날, 문을 열자 여간해서는 볼 수 없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휜 나뭇가지를 잡고 툭툭 떨어진 납작한 빛들을 본 순간 그 기억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 선명하게 기억한다. ‘엄마가 나를 저 끓는 물속에 넣어 버릴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과 마당에서 벌어졌던 매질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지켜보던 늙은 여자들과 무기력한 아버지의 눈이 기억의 화면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량의 기억 속에서 엄마가 매질을 했던 기억은 없었다. 그저 엄마는 말이 없고 조용히 밥이나 짓는 여자였다. 그저 평범했고 량은 총명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자랐다. 남자를 일찍 만난 것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량에게 그 기억이 끌려 나온 뒤 량은 급격히 말라갔다. 임신을 했어도 말라갔다. 묻힌 기억 하나가 끌려 나올 때마다 량은 끔찍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땀에 젖었다. 량의 배가 불러온다. 워낙 볼품없는 집안이라서 젊은 남녀는 바로 살림을 차렸다. 성실한 어린 남자는 부지런히 일했다. 엄마가 보잘것 없는 자신의 살림을 바리바리 싸 들고 온 날이다. 엄마의 작고 노란 양은 냄비가 엄마의 등짐에서 굴러떨어졌다. 엄마가 ‘애 저것 좀 들고 와라’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량은 이미 냄비를 주우려고 발을 떼고 있었다. 그때 전등의 빛이 양은 냄비에 닿아 눈부시게 빛났다. 작고 노란 양은 냄비, 기억 속에서는 분명 노란색이었는데 냄비는 어느새 노란 칠이 다 벗겨진 상태였다. 이 냄비는 지금까지 의심의 여지없이 노란색이었다. 전등의 빛이 그 착시를 흔들흔들거리며 깨고 있었다. 손잡이가 하얗게 변하더니 뚜껑 전체가 그리고 냄비의 안과 냄비의 뒤쪽까지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노란 양은 냄비에 완탕을 끓여와 엄마 앞에 놓는다. 엄마가 입속에 하얀 완탕를 넣는다. ‘애야 내가 손주를 보니 여한이 없다.’ 량은 그 옆에서 침을 꼴깍 꼴깍 삼킨다. 할머니가 량의 작은 몸을 옆으로 쓱 밀어내며 엄마에게 속삭인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야 젖이 잘 나오지.’ 엄마가 내 눈을 보며 국물까지 다 마신다.-- 그 기억이 되살아난 그날 량은 완탕을 솥으로 가득 끓여 양은 냄비에 담아서 먹었다. 그 기억이 끌려 나온 후 엄마와는 한 마디도 섞지 못했다. 어린 남편이 와서 웬 완탕을 이리 많이 끓였냐고 한마디 한다. 그래도 엄마와 량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말없이 완탕을 먹는다. 엄마는 조금 먹는 시늉만 했고 량은 양은 냄비에 담아 여섯 그릇을 먹은 후에 토하기 시작했다. 토하는 내내 등을 엄마가 두드려 주었을 때 량이 소리 질렀다. ‘내 몸에 손 대지 마!’ 엄마에게 내 기억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선명한 집 구조와 지붕 위에 걸려서 너풀거리던 붉은 연까지도 기억이 날 리 없지 않은가. 엄마는 일어나 자신의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왜 그러냐고 내 등을 한대 후려치지도 않았다. 엄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오 년 간의 봉인된 기억들을. 량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는 너무 작았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싶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남동생이 같이 생각났다. 이게 서서히 병증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다 지나간 일이라며 대담하게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면 온몸이 땀에 젖었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안릿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관련 뉴스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