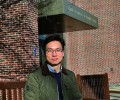우리 집에는 토끼 한 마리와 용 한 마리가 한 우리 안에서 산다. 남편과 한 살 터울인 우리는 서로 막내인지라 먹는 자리에서 양보가 별로 없는 편이다. 처음에는 그런저런 사소한 것들로 싸움을 종종 하고 살았다. 한 우리에서 산 지 25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용하게 산다. 남편은 과묵한 편이지만, '욱'하는 우뚝밸이 있는 성격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쪽의 결정에 따라 싸움이 좌지우지되곤 한다. 특별히 아침 시간일 때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쓰며 살기를 얼마이던가.
남편의 입에서 생각 없이 툭 떨어진 말을 잘 주워담다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약발을 기대하려면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약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25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이제야 조금씩 그 약의 효력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참 많이도 참고 누르고 기다리며 지냈던 날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남편은 무덤덤한 성격이라 아내인 내게 잔소리를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남편의 생각 없이 툭툭 던져진 말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결혼 15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세 아이를 학교에 다 보내놓고 조용한 시간을 택해 책상 위에 A4 용지를 놓고 제목은 '남편에게 나는 어떤 아내인가?' 하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중앙에 줄을 긋고 왼쪽에는 남편에게 '좋은 아내' 오른쪽에는 '나쁜 아내' 이렇게 써놓았던 기억이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내 하나 둘 써내려가니 내용이 점차 길어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방법은 참으로 귀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힐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25년을 살았다고 해서 아내인 내가 남편을 얼마나 알겠으며, 또한 남편이 아내인 나를 얼마나 알겠는가. 다만, 오래도록 함께 생활했기에 서로의 장단점을 탓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 것일 뿐이다. 살면서 '탓'으로 돌리자면 단 하루를 아니 단 한 시간을 조용히 살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나도 모를 때가 많은데 어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만을 기대하겠는가 말이다. 또한, 내가 나를 아는 나와 내가 모르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비치는) 나 모두가 다르기에 때로는 혼돈이 오기도 한다. 결국, 나는 나일 뿐이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가깝게 지내는 주변의 친구 부부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남편이 아내인 내 말을 잘 듣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집 안에서 부부의 일을 또 누가 알 것이며 소소히 부딪치는 일들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세 아이를 키우며 큰 소리 내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사람의 변함없는 뜬뜬함이 우선일 테지만, 때때마다 남편의 상황에 맞춰 조율하는 내 몫도 만만치 않았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25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남편보다도 세 아이가 엄마가 담당했던 이 역할을 알아주고 있음이 내게는 큰 힘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렁뚱땅이 없는 고지직하고 고집 센 남편 옆에서 함께 걸어가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열심과 성실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어떤 일이든 끝까지 책임감으로 사는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세 아이 역시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또 있겠는가. 남편을 보면서 자신보다도 가족을 위해 늘 애쓰는 마음과 희생하는 정신과 행동하는 삶에 아내인 나는 고맙기도 하고 부족한 내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조용히 있다 보면 가끔 남들에게 편안한 아내로 비치기도 하는가 보다.
지금도 우리 부부를 만나면 아내를 끔찍이 생각하는 공처가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토끼도 토끼 나름인 것을 말이다. 집토끼와 들토끼 그리고 산토끼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토기는 다름 아닌 산토끼인 까닭이다. 집안의 용도 무서워하지 않는 산토끼는 자기 마음대로 산도 오르내리고 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집에서는 조용히 머물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먹거리를 찾고 저녁이면 집에 올 줄 알고 계절(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그 말간 마음이 있어 고마운 일이 아니던가. 산토끼의 삶의 모습에서 용은 오늘도 많이 배우며 산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